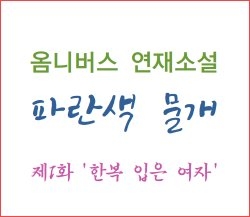 옴니버스 연재소설 『파란색 물개』 / 김산 作
옴니버스 연재소설 『파란색 물개』 / 김산 作
제1화 <한복입은 女子> (제6회)
백천길이 본격적으로 자세를 잡고 스타트선에 들어가려는 순간이다. 죽순이가 두 다리를 번쩍 들어 올렸다. 백천길의 허리를 양다리로 휘어 감는 순간이다. 백천길은 뒤에서 누가 떠민 것처럼 엉겁결에 달리기 시작했다.
백천길은 군대생활을 일산에 있는 백마부대에서 했다. 부대에서 먼 곳도 아니다. 보초를 서려고 오피에 올라가면 집 마당이 보였다. 어느 때는 마당에서 빨래를 하는 어머니에게 손을 흔들어 주기도 했다.
백마부대의 훈련소인 9사단 훈련소도 집 근처다. 다른 장병들은 열흘 전부터 송별회다, 뭐다 해서 총각딱지를 떼어준다, 기념사진을 찍는다, 훈련소 앞까지 동행을 한다. 눈물을 뿌리며 입소를 했다.
백천길은 논에서 일을 하는 아버지와 새참으로 삼양라면 끓여 먹고 집으로 와서 입대를 했다. 마침 어머니는 하나 밖에 없는 외아들 군대 간다는데 이웃집 아주머니와 쑥 뜯으러 갔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죽순이가 처음이다. 그 놈이 처음으로 여자를 구경하는 역사적인 날이었으니 얼마나 신이 났겠는가? 처음에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처럼 단숨에 고지를 달렸다.
“휴지 줄까요?”
죽순이도 백천길이 야생마처럼 날뛰니까 너무 좋았다. 다른 죽돌이들은 죄다 토끼들이다. 그윽한 시선으로 백천길의 가슴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아니!”
한 번은 억울하고, 두 번은 심심하고, 세 번은 괜찮고, 네 번은 즐기면서, 다섯 번째는 덤으로 하고 나니까 침대시트가 걸레가 되어 버렸다.
백천길은 하루 아침에 여자가 얼마나 오묘한 동물인지 경험을 했다. 그것은 용암처럼 온 몸을 녹이는가 하면 온천물처럼 뜨겁고, 겨울날의 난롯가처럼 따뜻하다. 깊이를 알 수가 없어서 숨이 막혔으나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곳이다.
훗날 백천길은 스스로 깨달았다. 젊었을 때는 여자의 그곳에 빠져죽지 않는다. 나이가 늘면 기운이 약해진다. 기운이 약해지면 돈이 도망을 간다. 결국 여자의 그곳에 빠져 죽고 만다는 진리를 터득하고 났을 때는 배도 떠났고 여자도 떠났을 때이다.
“으음! 오늘 예감 좋은 날이에요.”
죽순이는 너무 기분이 좋았다. 온 몸의 뼈를 모조리 빼내서 깨끗한 물로 행궈서 새로 조립한 것처럼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다. 평소와 다르게 나른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속삭였다.
“나도 캡이야.”
백천길을 그 후로 수많은 여자를 섭렵했다. 하지만 로열호텔에서 하룻밤을 같이 잔 이름을 알 수 없는 죽순이 얼굴이며 풍만한 젖가슴, 금방 숨이 넘어 가 버릴 것처럼 터트리는 신음소리, 상류로 기어 올라가는 연어처럼 가슴으로 파고들던 뜨거운 육체가 가끔 생각났다.
그렇다고 죽순이가 훗날 만난 여자들처럼 빼어난 미모가 있어서는 아니다.
오히려 기억에 남아 있는 로열호텔의 죽순이는 핸드폰에 이름을 올릴 수준도 못된다. 적당히 아랫배도 나왔고 팔뚝의 살도 있었다. 샤워를 하러 목욕탕으로 가는 뒷모습을 보니까 엉덩이도 쳐졌다. 얼굴은 그런 데로 귀여운 편이다. 그런데도 햇살 눈부신날 죽순이를 생각하면온 몸의 세포가 일제히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치며 뜨겁게 물결을 쳤다,
백천길은 바람을 피운 새댁처럼 문 뒤에 숨어서 뽀시시한 얼굴만 내 밀고 복도를 바라봤다. 카펫이 깔려 있는 복도는 쥐죽은 듯 조용하다. 그때서야 안심이 된다는 얼굴로 죽순이를 불러서 밖으로 나갔다.
“안녕.”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죽순이는 백천길이 뭐라고 말을 할 틈을 주지 않았다. 백천길의 통장에는 그녀가 죽었다 깨어나도 만져 보지 못 할 돈이 있다는 건 더욱 몰랐다. 그저 하룻밤 같이 보내고 쌈박하게 헤어지는 죽돌이였을 뿐이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을 번쩍 들어 보이며 걸어갔다.
백천길은 아쉬웠다. 차비라도 준다는 핑계로 다시 만나고 싶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십만 원이 그대로 있다. 그때만 해도 은행 금리가 15% 선이었을 때이다. 칠억을 은행에 넣어 두면 이자가 한 달에 팔백 만원 넘게 나온다는 사실을 몰랐다.
나중에 본격적으로 은행거래를 하면서 알아보니까 그날 대접 받은 것은 말 그대로 새족에 묻은 피에 불과했다. 백천길에 세상 물정을 알았으면 승용차 한 대 정도는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백천길은 죽순이를 따라 나가려도 누군가 앞을 가로막아서 멈췄다. 은행대리가 정월 초하루처럼 반갑게 인사를 했다.
“어, 어제는 신세 많이 졌습니다.”
백천길은 아쉬움을 안고 호텔 밖을 바라봤다. 죽순이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벌써 출근시간이 됐는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명동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아닙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대리님도 여기서 주무셨습니까?”
“사장님 덕분에 저도 하룻밤 잘 지냈습니다. 그 여자 괜찮죠?”
“괜찮기는 한데 뭐하는 여잡니까? 술집 여자 같지는 않던데……”
백천길이 나도 좀 놀아 본 놈이라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어이구, 제가 사장님한테 감히 술집 여자를 소개해 주겠습니까? 대학생이랍니다.”
“대학생?”
백천길은 여대생하고 아침부터 섹스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은근히 기분이 좋았다. 상대적으로 사귀고 싶은 생각이 더 들었지만 이미 배는 떠났다.
“일단 아침을 드셔야죠.”
“아닙니다. 어디 가서 라면이나 한 그릇 먹으면 됩니다.”
(다음 회에 계속)
|